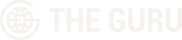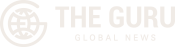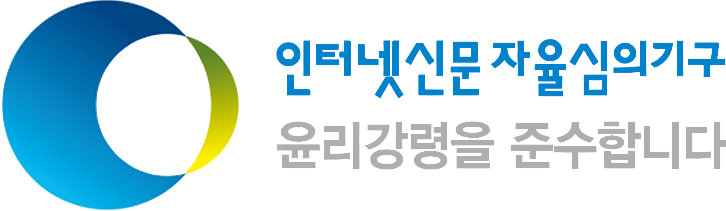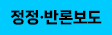#엑슨모빌(XOM)
-

엑손모빌, 최대 '11조원' 규모 LNG선 30척 발주…韓 조선 3사 수주 물망
[더구루=길소연 기자] 미국 LNG 공급 확대의 중심축으로 꼽히는 에너지 대기업 엑손모빌이 최대 11조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 신조 발주에 나선다. 미국산 LNG 생산·수출 확대를 위한 대형 가스전 및 액화 설비 개발 사업에 따라 LNG 운송에 필요한 신규 LNG 운반선을 주문한다. 건조사 후보 물망에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 '빅3'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오를 전망이라 수주 기대감이 높다.
- 길소연 기자
- 2026-02-23 08:49
-

'한국석유공사 참여' 인니 탄소 포집·저장 사업 본격화
[더구루=길소연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탈탄소화 프로그램인 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이 본격화된다. 석유공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종료된 폐(閉) 유전·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재활용한다. 시추로 고갈된 유·가스전 내 빈 공간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컨벤션 센터(ICE)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석유협회(IPA) 컨퍼런스에서 인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르타미나와 인니 CCS 허브를 개발하는 아스리 분지 프로젝트의 이산화탄소 저장 계약을 체결했다. 니케 위드야와티 페르타미나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석유공사 파트너십에 참여해 배출가스를 CCS 시설에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와 페르타미나는 지난 1월 인니 CCS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협약(JSA)을 체결한 이후 개발 계획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JSA를 계기로 페르타미나와 인도네시아 자바 섬 북서쪽 해상의 폐유전과 폐가스전에서 CCS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인니는 수백 기가톤의 이산화탄소(CO2)를 저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 길소연 기자
- 2024-05-16 08:08
-

BP·엑슨모빌 등 메이저 석유기업, 러·우 전쟁으로 '375조원' 수익
[더구루=길소연 기자] 세계 최대 석유 회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810억 달러(약 375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한이 화석 연료 가격 급등을 촉발시킨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 길소연 기자
- 2024-02-20 09:55
-

한국투자공사, '고유가 호재' 美 에너지주 쓸어담았다…빅테크주 축소
[더구루=홍성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 2분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에너지주(株)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에 힘입어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휘청인 빅테크 기업의 비중을 축소했다. 16일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유 주식 현황 보고서(13F)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분기 △마라톤오일 △아파치 △타르가 리소시즈 주식을 신규 매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텍사스 기반 석유회사인 마라톤오일 주식 65만7400주를 매수했다. 6월 말 기준 지분 가치는 1480만 달러(약 19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대기업인 아파치와 타르가 리소시즈를 각각 38만8700주(1360만 달러, 약 180억원)·20만7800주(1249만 달러, 160억원)씩 새로 사들였다. 또 미국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의 주식을 29만883주를 추가로 매수하며 보유 주식 수가 416만112주로 늘었다. 주식 가치는 3억5630만 달러(약 4470억원)에 이른다. 에너지 기업들이 고유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엑슨모빌
- 홍성환 기자
- 2022-08-16 12:22
-

[단독] 삼성중공업, '1.5조 규모' LNG선 6척 수주…연간목표 달성 '청신호'
[더구루=길소연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에너지업체 엑슨모빌로부터 최대 6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엑슨모빌은 삼성중공업에 17만4000CBM급 LNG 운반선을 최소 2척에서 최대 6척까지 발주할 예정이다. 엑슨모빌은 지난 2020년 삼성중공업에 14척의 LNG 운반선 신조선 선석을 예약했었다. 그 중 6척에 대한 용선계약을 선주들과 계약했고 아직 8척이 남았다. <본보 2020년 1월 17일 참고 '에너지 공룡' 엑슨모빌, 삼성중공업에 LNG선 14척 건조 예약> 그러나 8개 슬롯 중 최소 2개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소멸되면서 최종적으로 6척 주문이 남았다. 이에 엑슨모빌은 자회사 SRM(SeaRiver Maritime)을 통해 신조 발주한다. 선가는 비공개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선주인 MISC가 성중공업에 주문한 17만4000CBM 이중 가스엔진(X-DF) 선박 가격이 척당 2억 달러(2600억원)로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엑슨모빌이 신조 발주하는 건 미국에서 진행하는 LNG 생산 프로젝트 때문이다. 미국 골든 패스 LNG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출 화물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LNG 운반선
- 길소연 기자
- 2022-08-02 10:16
-
조선·철강
그리스 해운 명문家 "장금상선 'VLCC 선대' 구축 프로젝트, 놀라운 일" 공개 찬사
[더구루=오소영 기자] 그리스 탱커 선사인 오케아니스 에코 탱커(Okeanis Eco Tankers)가 장금상선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매입에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다. 장금상선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화주들의 선택 폭이 좁아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운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VLCC 시장의 주도권이 국영 석유회사에서 민간 선사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원전
美 일리노이 주지사, 신규 원전 건설 가속화 행정명령 서명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州)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구상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