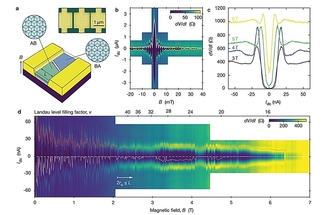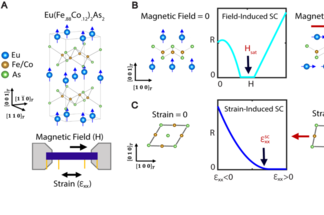[더구루=한아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중국 시장 진출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중국 제약 시장 진입 시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분석도 나오는 반면 미·중 갈등으로 기업 경영 리스크가 크다는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어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16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중국 내 글로벌 제약사들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중 지정학적 갈등 악화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홍콩이나 상하이에 중국 사업을 담당할 별도법인 설립이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곧바로 '잘못된 정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선 별도 법인을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 사업을 축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요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 중국에서만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 중 13%에 달한다. 중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기업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신약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신규 투자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중국 사업에 주력하는 제약사 대부분 미·중 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도 중국 내 글로벌 제약사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제약 바이오 사업은 긍정 요소가 크지만 리스크도 끌어 안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인 만큼 시장에 안착할 경우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다만 불확실성도 크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 기업 경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심한 것도 문제다. 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실행한 개정 반(反)간첩법(방첩법·Anti-Espionage Law)이 대표적이다. 방첩법은 처벌 대상 기밀 유출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해 법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선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분간은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연구자나 사업가도 이 법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 경영 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